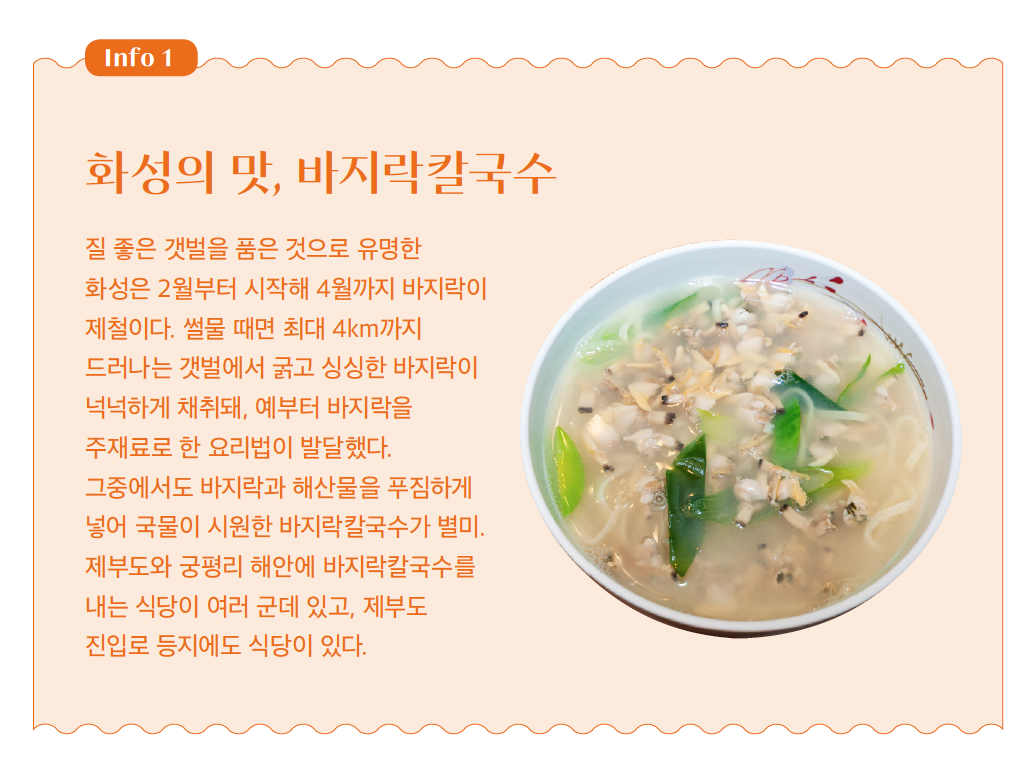물길 따라 걷다
어느 눈부신 날,
화성의 봄
화성호를 따라 자박자박 걷기 좋았던 봄날의 하루. 물결은 종일 햇살처럼 튀었고 갈대는 바람 따라 흔들렸다. 미처 몰랐다. 철새를 품은 습지가 이토록 아름다운지. 해운산에 올라 수평선 위로 가늘게 뻗은 낙조는 숨 막히는 절경 그 자체였다. ‘그렇지, 이게 서해의 맛’이지 했다. 경계를 길 삼아 바다와 호수 사이, 호수와 산 사이, 호수와 농지를 이어 걸었다. 시간은 여유롭지만 허전하지 않게 흘렀고, 풍경은 완전히 겨울을 지나 봄의 어귀로 흐르고 있었다.
글. 이시목(여행작가) 사진. 이시목, 화성시청

화성호와 습지
화성호는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궁평리 사이를 연결하는 화성방조제가 건설되어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방조제 주위에는 거대한 습지가 있어 매년 봄이면 도요새 물떼새들이 찾아든다. 화성호 주변 습지는 지난 2018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의해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 보존 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거닐며
내내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졌던 3월이 지나고, 넓은 화성의 대지 위에도 서서히 봄의 초록빛이 물들기 시작한다. 가을인 듯 갈대가 무성했고, 겨울의 여느 날처럼 철새들 무리 지어 날았다. 봄볕 푸지게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초록빛 얕게 스민 갈대의 밑동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지없이 겨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봄은 그렇게 아리송하게 밀고 당기는 계절이 아니던가. 화성의 4월은 그토록 모호한 풍경으로 빛나는 간절기였다. 정체성이 불분명해 더 끌리고, 두 계절이 혼재돼 보다 매혹적인.
습지나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을 오랜 시간 좋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바다와 호수처럼 성질이 다른 두 공간 사이나 언저리에 불분명하게 걸쳐져 있는 습지의 매력. 무엇보다 풍경에 고유성이 짙어 좋아하게 됐다.
우음도처럼, 개발이 더뎌 자연스럽고 평범하지 않아 여행의 묘미가 더한 곳이 바로 화성이다. 그 ‘사이’란 공간이 갖는 모호성에 끌려 화성을 찾았고, 경계지 특유의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혹해 진종일 이곳을 맴돌았다.
자연에서 경계지는 주로 완충지대를 뜻한다. 경기 서남쪽 해안에 있는 화성은 독특한 경계지가 많은 도시 중 하나다. 바다와 호수를 경계 짓는 방조제가 여럿 있고, 뭍과 섬을 잇는 노둣길도 선명하다. 덕분에 화성을 여행하는 일은 늘 경계를 넘나드는 기분이었고, 이를 누빌 때마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수역의 풍경이 좋다. 4월에 화성을 찾아 거닌다는 것은 시‧공간의 ‘사이’를 만끽한다는 뜻일 것이다.
▼ 도요새, 저어새 등이 머무는 화성습지의 화성호 풍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50여 년간 미 공군사령부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던 ‘쿠니사격장’ 부지를 공원으로 재단장한 곳. 33만 3천578㎡ 면적에 습지원, 초화원, 매화숲 등을 조성해 놓아 봄날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고, 너른 잔디마당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걷기에도 좋다. 유채꽃 피는 4월 하순경은 방문 적기다. 공원 내에 평화기념관과 화성시 공예문화관이 있다.

화성호에서 발견한 봄의 소식
화성에서 경계지의 풍경이 가장 도드라지는 곳은 시화호와 화성호다. 그중 걷기에는 화성호가 제격이다. 화성호는 화옹지구 간척농지 개발을 위한 방조제를 설치하면서 생긴 인공호수로, 그 언저리에 거대한 습지를 품고 있다.
첫걸음은 화성방조제에서 시작하는데, 제법 긴 구간의 습지를 따라 흐른다. 갯벌습지와 염습지, 민물습지, 호수가 모두 존재해 생태자원적 가치가 높다는 화성습지는 물갈퀴가 없어 물에 뜨지 못하는 도요새 물떼새들이 만조 시 바닷물을 피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파도가 급히 밀려올 때마다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으니 봄철 이곳에서는 누구든 오래 멈춰 응시해 볼 일이다. 때때로 갈대숲 사이에서는 호숫물 출렁대는 소리도 들릴 테니 슬그머니 자연의 소리에 귀를 열고 걸어 봐도 좋겠다.
기다랗게 뻗은 방조제를 따라 걷다 보면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다다른다. 과거 미군의 폭격 훈련장이었던 이곳은 포성이 멎은 후 아기자기한 공원이 됐다. 유채꽃 일렁대는 산책길을 걷다 어디든 앉으면, 노란 꽃 넘어 낮은 언덕에서 바다를 응시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난다.
비록 동상이지만 누군가의 등을 오래 바라보는 것은 늘 마음을 가만히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 그이의 애쓴 걸음이 애쓴 삶 같아서. 그러다 어느 순간엔 내삶의 어느 대목이 문득 안쓰러워져 울컥할지도 모른다.
▼ 세계 건축 거장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전망대.

궁평항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내륙을 오목하게 파고든 포구를 중심으로 북측에는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해안산책로가, 남측에는 해상 낚시터가 조성돼 있다. 방파제 끄트머리쯤에 있는 정자(궁평루)가 일몰 포인트로 꼽힌다.

▲ 화성방조제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등대. 방조제를 중심으로 바깥쪽이 바다, 안쪽이 호수다.
호수와 바다가 붉어질 무렵엔
길게 뻗은 방조제가 산티아고 순례길마냥 한없이 걷기에 좋지만, 그 길이 고루하게 느껴진다면 단숨에 돌아와도 좋다. 고즈넉한 항구, 궁평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끌벅적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궁평항은 한때 애착 여행지였던 곳이다. 마음 쓰라릴 때마다 또 무겁게 내려앉을 때마다, 내륙으로 오목하게 패인 항구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마음이 오목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잠겨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잠시 바다 위로 길을 낸 데크를 걸어 바다에 닿았다. 목을 길게 빼고 내려다본 바다는 고요히 소란했다. 밀려드는 중인 것이다. 궁평리가 품은 해안에서는 모래와 파도, 노을과 함께 기암절벽까지 가세해 바다와 뭍의 경계를 지키는 듯했다.
궁평항에서 바다를 등지고 다시 호수에 바짝 붙어 걷는다. 왼쪽은 간척농지이고 오른쪽은 호수다. 호수와 농지 사이를 간드러진 ‘S자형’으로 지나는 자전거도로가 ‘화성호 둘레길’이다. 햇살 환한 날이면 호수에 내린 봄볕이 저녁 무렵까지 별 무더기처럼 찰랑대 마음 오래 흐뭇하다.
여행의 마지막 길은 해운산이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겸 뉘엿거리는 서해의 낙조를 벗 삼아 천천히 산에 오른다. 해운산은 낮지만 멀리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다. 들녘이 지평선을 길게 펼친 솜씨를 바라보기에도 좋고, 바다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방조제를 바라보기에도 좋다. 바다와 호수 사이에 있는 습지도 한눈에 담고 싶어 올랐다. 걸어온 하루가 붉게 물들고 저무는 동안, 하늘에는 어느새 조각달이 떴다.
▼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조성한 궁평항의 해안산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