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February VOL. 659
2023. February VOL. 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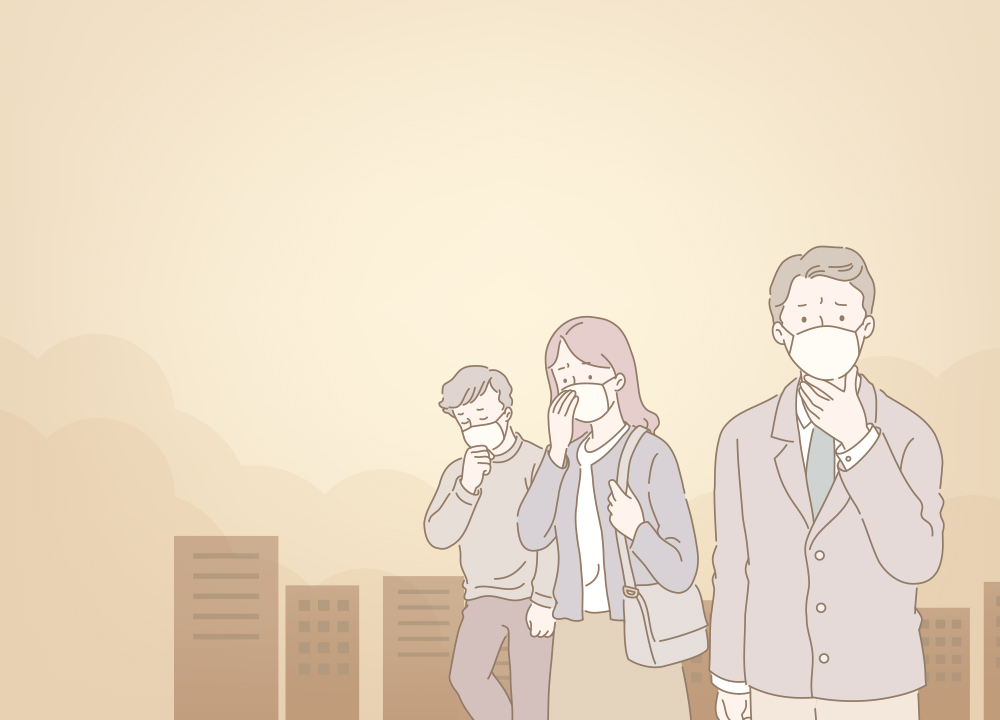
흔히 ‘미세먼지’라 부르는 이것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크기로 구분한 것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는 PM10, 그보다 더 작은 2.5μm 이하인 입자는 PM2.5라고 부르죠. 우리 표현으로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통상 기준으로 쓰이는 것은 PM10이 아닌 PM2.5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의 ‘보통’과 ‘나쁨’을 가르는 기준점, 우리나라의 법정 대기환경기준은 35㎍/㎥입니다.
통상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높아집니다. 연료 사용량이 늘어 배출량 자체가 증가하고, 대기혼합고가 낮아지며, 북서 계절풍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이 늘고, 강수가 적어지며,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여러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이 빚어지게 되죠. 이들 요인을 살펴보면, 날씨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배출량의 증가도 결국 ‘추운 날씨’의 영향 때문이고, 대기혼합고가 낮아지고, 북서 계절풍이 불며, 비가 적게 내리는 것 역시 날씨(또는 기후)의 영향이죠 .
이 요인들 가운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배출량’입니다.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입자 자체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를 줄인다 하더라도 당장 대기혼합고가 낮아지고, 대기정체가 발생한다면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기혼합고는 말 그대로 대기가 순환을 하면서 위아래가 섞이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높이는 크게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여름보단 겨울에, 낮보다는 밤에 혼합고는 낮아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체육관에서 한 사람이 트림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데 좁은 컨테이너 속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모두가 그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기혼합고가 낮아진다면 농도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대기정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간은 같은데 창문의 개폐 여부에 따라 냄새를 맡는 사람의 수는 달라지겠죠. 그 냄새가 빠르게 공간을 빠져나가느냐, 그대로 고여 있느냐가 달라지니까요.
지난 1월 초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은 이러한 대기정체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파특보가 해제되기 무섭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통상 우리가 ‘국외유입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서해 백령도 관측소의 농도가 가장 먼저 치솟기 시작하고, 몇 시간 후 인천, 서울 및 경기, 충청과 강원 영서의 농도가 시차를 두고 차례로 오릅니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에 곳곳이 뒤덮이는 것이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기 시작했을 때 백령도 관측소의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역시 1월 6일 부산과 울산에 먼저 내려졌습니다. 이후 7일, 저감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죠. 왜 그랬을까요? 대기정체로 곳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하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엔 해풍의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기오염물질이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 한 겁니다. 여기에 대구의 분지 지형은 경북권의 농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대기정체에 공기가 분지 내에 가둬지게 되니까요.
삼한사미를 바꾸기 위해선 그저 ‘입자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고농도 현상을 부르는 여러 요인 중단 하나만을 통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도 아니고, 날씨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선 다음 달 ‘지구보고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