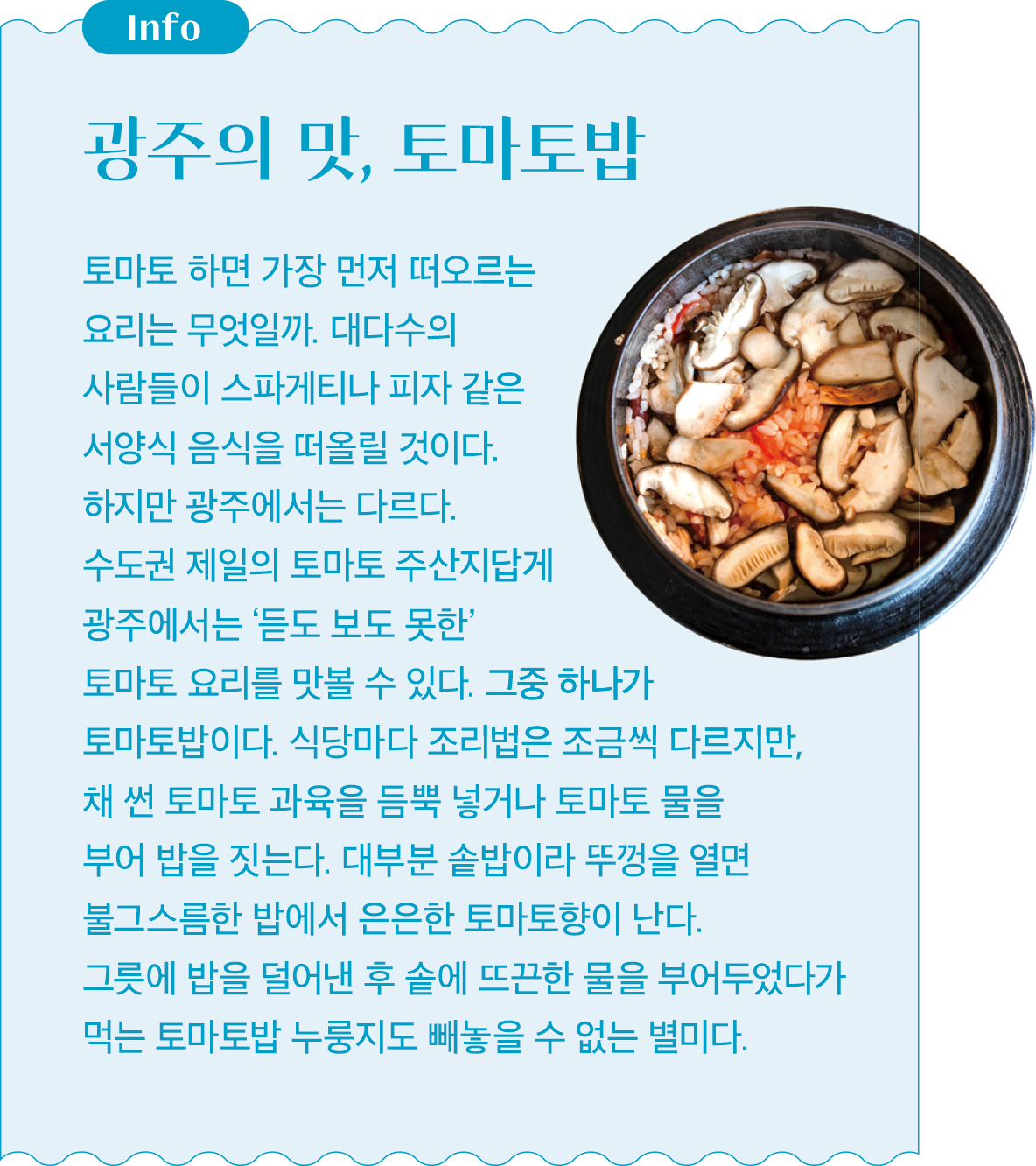물길 따라 걷다
더울수록 빛나는
광주의 초록 그늘
경기도 광주에 숲을 만나러 갔다. 볕이 뜨거울수록 짙어지는 숲의 서늘한 그늘을 풍족하게 누리고 싶어서. 기대만큼 숲은 울창했고 그늘 또한 두터웠다. 그 그늘에서 하루 내 꽃밭을 거닐고, 낮잠을 자고, 이윽고는 휘황한 도시의 야경도 누렸다. 더운 여름날에 가볍게 콕, 쉼표를 찍었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화담숲


그늘 짙은 여름 한낮의 숲
한때는 계절을 구분 짓는 일에 열심이었다. 언제부터가 봄인지 여름인지 또 가을인지. 봄은 어쩐지 바람이 차지 않다 싶을 때 비로소 온 것 같았고, 그늘을 찾아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여름인 듯했다. 매해 여름 버릇처럼 숲 그늘을 찾아다닌 건 그래서였다. 짙은 그늘에서 깊은숨을 ‘후-’ 하고 들이마실 때마다, 내 숨 속에 숲 냄새가 가득 차는 게 좋았다.
여름은 숲이 가장 우거진 때다. 점점 더 푸르게 울창해져 어둡도록 빽빽해진다. ‘사람 홀리기 딱 좋은 숲!’이란 말을 그맘때 지인에게 처음 들었다. 화담숲에서도 그늘이 가장 짙다는 양치식물원에서였다. “여름엔 여기만 한명당이 없다.”라며 잠시 쉬어 가자는 지인의 제안에 제법 긴 시간 숲 그늘을 즐겼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쳐 들어,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화담숲은 사실 여름보다 가을에 찾는 이들이 많은 곳이다.
단풍이 지극히 고와서다. 하지만 여름이 키운 숲에서 여름을 잊어본 적이 있는 이들은 안다. 살갗에 닿는 기온이 ‘조금 낮다’ 싶은 순간을 알아채는 일의 소중함을. 여름날의 화담숲에서는 내 몸의 사소한 변화까지 그렇게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신체감각이 또렷해진다. 하얀 자작나무숲에서도 반딧불이가 사는 계곡 언저리에서도 여름은 잊힌다.
화담숲에서는 여름내 꽃이 피고 진다. 노란 원추리며 뻐국나리, 벌개미취, 비비추 같은 여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숲을 밝힌다. 그중 돋보이는 꽃은 단연 수국이다.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수국은 초록의 숲 그늘을 푸른빛으로 채색하는 주인공이다. 크고 작은 송이의 꽃들이 한 다발을 이루는 나무수국이 신비로운 빛깔의 ‘여름 한 다발’을 불쑥 내밀어 눈이 호강한다.

▲ 화담숲 일대를 순환하는 모노레일. 입장권과 함께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시간이 내게 알려 주는 것들
사람의 성장은 계단처럼 이뤄진다고 한다. 그때마다 수평과 수직의 모서리에서 몸살을 앓는 이들이 많다. 그래야 비로소 올라지는 한 계단이 우리 삶의 시간이다. 숲의 시간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흐른다. 나무는 줄곧 키를 높이고 품을 넓히며 자란다. 팔당물안개공원은 나무의 성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몇 년 전 여름이었다. 무엇 하나 거치지 않고 쏟아져 내리는 여름 햇볕은 섬뜩하리만치 뜨거웠다. 피할 그늘이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았고, 바람이 불었지만 시원하지 않았다. 그랬던 공원이 나날이 무성해져 지금은 쉬어 가기 참 좋은 숲이 됐다. 그늘 또한 짙어 누군가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소풍을 즐기고, 누군가는 등을 뉘어 까무룩 잠에 빠진다. 그늘 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크닉을 즐기는 이들도 있고, 두물머리가 보이는 물가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는 이들도 있다. 두물머리가 가장 잘 보이는 그늘 아래 벤치는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다.
햇살이 살짝 기울 무렵에는 산책을 해 보자. 여름의 색이 도드라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공원에서 손꼽히는 산책 포인트. 이 길을 걷는다는 건 짙은 초록 그늘을 충분히 즐긴다는 뜻이다. 때때로 숲 그림자 나비처럼 내려앉아 바닥이 꽃 핀 듯 일렁대니 기분까지 묘하게 어른댄다.
팔당물안개공원은 본래 육지였던 곳이다. 1973년 팔당호가 조성되면서 섬이 되었고, 2012년 섬과 육지를 잇는 인도교가 놓이면서 다시 뭍이 됐다. 뭍과 섬 사이 습지에서는 여름마다 연꽃이 무리 지어 피고 섬과 호수 사이에서는 물새들 자주 난다.
되짚어 보면, 살아내는 일은 늘 녹록지 않았다. 지금 내가 선 시간이 수평의 모서리이건 수직의 모서리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머물러 있는 지금의 자리가 나무처럼 이로운 방향에 놓여있기를 소망한다.

▲ 1973년 조성된 팔당호. 팔당호가 조성되면서 팔당물안개공원 섬이 되었다.

‘해 질 녘’이 주는 깊은 위로
342번 지방도는 팔당호와 남한산성을 잇는다. 남벽수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길에서는 늘 계절을 닮은 바람이 분다. 2001년이었나. 단풍이 산불처럼 번지는 계절에 이 길을 처음 달렸다. 한 굽이 돌아서면 한 굽이 나타나고, 한 굽이 넘어서면 또 한 굽이 다가서던 길은 무척이나 감미로웠다. 이후 시간이 무료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길을 찾았다. 터널을 이룬 숲길을 달리며차창을 한껏 내리면, 어느 때이건 계절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무릇 사람이든 자연이든 익숙해지려면 서로에게 길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겐 풍경에 길드는 시간이 곧 여행이다. 안 지 오래된 풍경을 지금껏 알아가며 즐기고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남한산성은 방어용 성곽이다. 성(城)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등을 쌓아 올린 장애물을 말한다. 학자들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쌓은 담을 성곽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기원전 1000년 전부터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산에 성벽을 쌓았다고 하니, 예부터 사람들에겐 지킬 것이 참으로 많았나 보다. 남한산성만 해도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매 시기 격전의 현장이었으니, 뺏고 지키기 위한 인간의 싸움은 질기도록 길었다.
해 질 녘엔 서문 전망대와 연주봉옹성에도 오른다. 이 두 곳은 많은 이들이 남한산성에서 유독 오래 머무는 자리다. 서문은 삼전도와의 거리가 가장 짧아서 인조가 청군에 굴복하러 갈 때 나섰던 문이다. 지금은 이 문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본다. 과거를 들여다보듯 찬찬히 내려다보는 삼전도(잠실 인근의 나루터) 일대 들판이 은은하게 빛나는 ‘별밭’ 같다. 밤은 그렇게 적당히 감춰 더 매력적인 시간이다.

▲ 인조가 청군에 굴복하러 갈 때 나섰던 서문. 지금은 이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본다.


▲ 남한산성 서문 일대에서 바라본 서울시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