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지구
물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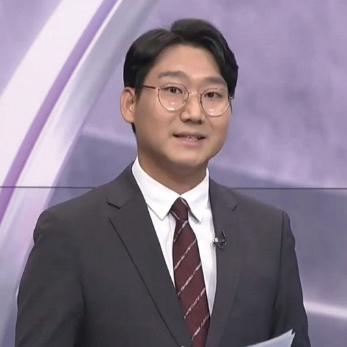
📝글. 박재훈 TV CHOSUN 기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여름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마치 ‘숨을 쉬려면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당연한 얘기지요. 그리고, 당연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작년 여름은 지독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경신될 줄 알면서도 기사 제목에 ‘최장 열대야’를 써 붙이길 몇 차례나 반복했고, 100년 빈도·200년 빈도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하늘이 뚫린 듯한 비는 자주 쏟아졌습니다. 질긴 더위는 좀체 물러가지 않았고, 은행나무는 10월 중순이 되도록 초록빛이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12월에 들어서기도 전에 폭설 취재를 나갈 수 있음을, 소한은 춥고 대한은 포근할 수 있음을 저는 이번 겨울에야 알았습니다.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널뛰는 날씨에 ‘겨울엔 그저 따뜻하게만 입고 나가면 되지’ 하던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이렇듯 바꿔놓았습니다.
대격변의 중심엔 단연코 물이 있습니다. 한껏 뜨거워진 채 한반도를 데우는 바다도 물이요, 여기서 폭우·폭설이 되어 땅 위로 들이치는 것도 물이니까요. 변하는 것은 기후지만, 인류가 생존을 위해 걱정해야 할 것은 결국엔 물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물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의 홍수에 휩쓸려 나갈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과 막 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가며 거대한 댐을 만들고, 전국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모두 물을 다스리는 힘으로 우리의 ‘당연한 삶’을 지키기 위함이었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당연한 삶을 지키기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 여름이면 튀어나오는 ‘녹조’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집중호우로 부유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어옴에 따라 전에 없던 녹조가 말썽을 부립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실제 인간에게 해를 끼쳤든 끼치지 않았든, 논란 자체가 치수 정책을 펼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취재를 한 경험이 있는 저 역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쓸 당시엔 어렴풋이나마 개념을 이해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춰보려니 따져봐야 할 내용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독성 물질이니 인간에게 위험하다’라는 게 오히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강화도 험난합니다. 특히 물그릇 확장에 대한 찬반 대립이 날카롭죠. 내가 태어나 이제껏 살아온 마을에 갑자기 댐이 들어선다면 어느 주민이 선뜻 ‘좋아라’ 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그에 따른 물의 중요성은 아직 ‘우리’의 문제가 아닌 ‘너희’ 의 문제에 그칠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물은 더 이상 ‘너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는 당연한 얘기가 돼야 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 가운데 물을 사 먹게 되리라 상상한 분이 계셨을까요.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24시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근을 준비하며 샤워를 하고, 점심밥과 저녁밥을 먹으며 1L의 물을 마시고, 산책 겸 한강변을 좀 걸은 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세수하러 틀어놓은 세면대 수도꼭지에서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있어 줄 거지?” 우리의 당연한 것들이 앞으로도 당연한 것들로 남아주길 바라며, 저는 물에게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