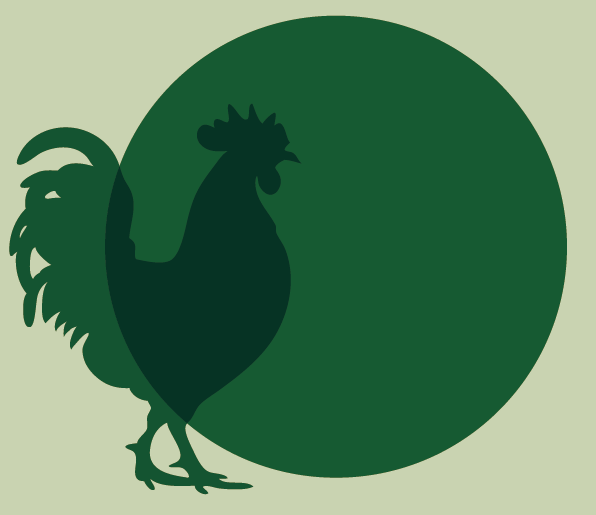
앨리스 워커와 닭
흑인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앨리스 워커는 닭 애호가였다. 닭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물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거트루드 스타인’ 등의 멋들어진 이름을 붙여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한때는 무려 닭 12마리와 생활하며 관찰했던 닭의 습성, 닭들에게 쓰는 편지 등을 묶어 『닭 연대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닭들은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열린 공간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라는 말에서 그는 닭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